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및 상단메뉴
본문 및 주요 콘텐츠
중국뉴스
문화·예술
[책읽는 상하이 132] 말, 혹은 살로 맺은 동행의 풍경
등록일 : 2022.04.29 09:07:53
조회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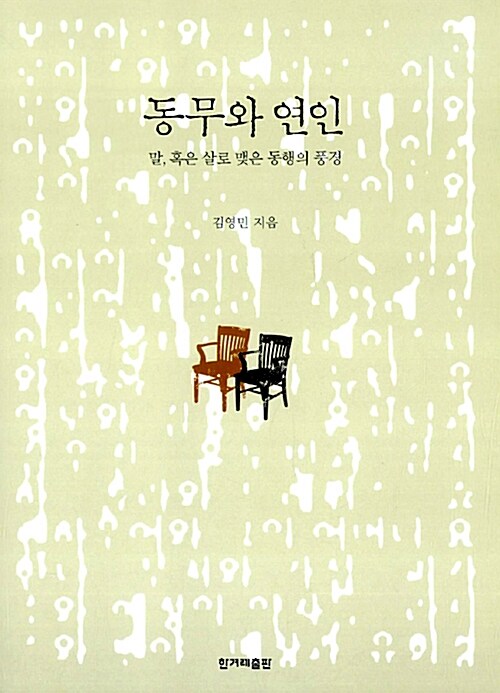
김영민 | 한겨레출판사 | 2008.03.28
동행이라는 말처럼 편안하고 따스한 말이 또 있을까? 친구든, 연인이든, 또 다른 관계든 동행의 길이 빛날수록 돌아서는 순간은 더욱 날이 선 비수가 되는 법.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만큼 신뢰도 줄어든다. 자연스레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역시 가물어간다.
김영민은 책에서 공통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동지’나 사적 우연성으로 뭉친 친구와는 다른 “서로 간의 차이가 만드는 서늘함의 긴장으로 이드거니* 함께 걷는 동무(同無)”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차이가 만드는 서늘함”이 아닐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범인(凡人)들은 그 서늘함의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동무로도 연인으로도 머물기 어렵다. 하지만 ‘보부아르와 사르트르’,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사귐에서 특별한 것은 서로의 육체(연인)가 아니라 그의 ‘입(동무)’과 그녀의 ‘귀(동무)’였다. 뜨거운 연애의 순간이 지난 후 말을 가운데에 두는 ‘지적 반려’로 관계를 이은 것이다.
그렇다면 말의 이어짐은 쉬운 것인가. 어쩌면 장미꽃을 내미는 에로스보다 어려운 것이 말인지도 모르겠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진실과 존경의 산을, 존중과 인내의 파도를 넘어야 하니까 말이다. 가식적 긍정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
이에 다정한 듯 서늘한 이덕무와 박제가 같은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는 물론 재기(才氣)마저 갉아먹는 어긋난 관계들도 소개된다. 한 집안의 두 천재를 인정하지 못했던 어머니 요한나와 쇼펜하우어처럼 호의로 포장된 지옥을 살거나, 피카소의 에고이즘 속에 죽음 또는 정신이상으로 예술적 영감의 불쏘시개가 되어 바스라진 여인들의 피 역시 씁쓸하게 구경할 수밖에 없다. 끝도 없는 이야기로 새벽을 맞아도 좋을 동무(同無)가 참으로 그리운 밤이다.
*이드거니: 충분한 분량으로 만족스러운 모양.
ksjung
외국에 살다 보니 필요한 책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책벼룩시장방이 위챗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화요일마다 책 소개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문화의 소비자로만 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해 교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